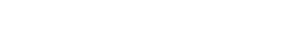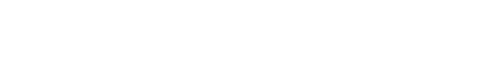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김문식, 1761년 조선 사신단의 청 문묘제도(文廟制度) 이해, 2024.09
- 작성자: admin(단국대)
- 작성일: 2024.10.18
- 조회수: 420
본고는 1761년에 북경을 방문한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의 문묘제도를 이해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홍계희를 대표로 하는 조선 사신단은 1761년 1월 8일에 북경의 태학을 방문하였다. 조선 사신단이 문묘제도를 이해하는 방식은 주나라와 명나라의 제도를 중시하고, 청나라의 제도를 비판하였다. 홍계희는 태학에 남아있는 석고를 주나라 문물로 이해하고 매우 귀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명나라는 방어시설을 정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으나 청나라는 명나라가 건설한 성벽조차 온전히 보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청나라의 역대제왕묘에서 명나라 신종 황제의 위패를 뺀 것을 비판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해 준 신종의 공덕을 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계희는 청나라의 문묘에서 송나라 6현(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에 대한 예우가 소홀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조선에서는 6현의 위패를 대성전의 종향위로 올려서 제사를 지냈으나, 청나라는 주희만 종향위로 올리고 나머지 5현은 여전히 동무와 서무의 종사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 학계는 송학을 정학으로 여겼고, 청은 송학과 함께 한학을 중시한 결과였다. 조선의 문묘제도는 송나라와 원나라의 제도를 따랐으며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변화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1761년에 북경을 방문한 조선 사신단은 조선의 문묘제도를 기준으로 청의 문묘제도를 비판하였다. 조선과 청은 공자를 최고의 스승으로 모시는 유교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자국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묘제도를 운영하였다.
This paper reviewed the way the Joseon envoys who visited Beijing in 1761 understood the Qing Dynasty’s Munmyo system. On January 8, 1761, the Joseon envoys, representing Hong Gye-hee(洪啓禧), visited Taihak(太學) in Beijing. The way the Joseon envoys understood the Munmyo system emphasized the systems of the Zhou and Ming dynasties and criticized the system of the Qing Dynasty. Hong Gye-hee understood the stone drums(石鼓) remaining in Taihak as the culture of the Zhou Dynasty and considered them very precious. In addition, he praised the Ming Dynasty for strengthening the defense by overhauling defense facilities, and criticized the Qing Dynasty for not fully repairing even the walls built by the Ming Dynasty. He also criticized the exclusion of the plaque of Shinjong, the emperor of the Ming Dynasty, from the Royal Ancestral Temple of the Qing Dynasty. At that time, Joseon was honoring the meritorious deeds of Shinjong, who saved Joseo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Hong Gye-hee strongly criticized the neglect of the courtesy of the six Confucian scholars of the Song Dynasty(Ju-doni, Jeong-ho, Jeong-i, So-ong, Jang-jae, and Ju-hee) at the Munmyo Shrine of the Qing Dynasty. In Joseon, the six Confucian scholars’ plaques were raised to the Daeseongjeon Hall for rituals, but in the Qing Dynasty, only Ju-hee’s was raised to the Daeseongjeon Hall, and the other five scholars’ plaques were still placed in Dongmu(東廡) and Seomu(西廡). At that time, scholars in Joseon regarded Songhak(宋學) as an orthodox study, and scholars in the Qing Dynasty emphasized Hanhak(漢學) along with Songhak. Joseon’s Munmyo system followed the systems of the Song and Yuan dynasties and did not accept any changes in the system during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e Joseon envoys who visited Beijing in 1761 criticized the Qing Dynasty’s Munmyo system based on the Joseon Dynasty’s Munmyo system. Joseon and Qing had a common point as Confucian countries that served Confucius(孔子) as the best teacher, but two countries operated Munmyo system in a way that emphasized their characteristics.
本稿は1761年に北京を訪問した朝鮮使臣団が清の文廟制度を理解する方式を検討した。洪啓禧を代表する朝鮮使臣団は1761年1月8日に北京の太学を訪問した。朝鮮使臣団が文廟制度を理解する方式は、周と明の制度は重視し、清の制度は批判した。洪啓禧は、太学に残っている石鼓を周の文物と理解し、非常に貴重だと考えた。また、明は防御施設を整備して国防を堅固にしたが、清は明が建設した城壁さえまともに補修しないと批判した。そして彼は清の歷代帝王廟から明の神宗皇帝の位牌を除いたことを批判した。当時朝鮮では、文禄の役で朝鮮を救援してくれた神宗の功徳を称えていたためである。 洪啓禧は清の文廟で宋の6賢(周敦頤、程顥、程頤、邵雍、張載、朱熹)に対する礼遇が疎かであることを強く批判した。朝鮮では6賢の位牌を大成殿の從享位に上げて祭祀を執り行っているが、清は朱熹のみ從享位に上げ、残りの5賢は依然として東廡と西廡の從祀位に置いていたためである。当時、朝鮮の学界は宋学を正学と考え、清は宋学とともに漢学を重視した結果である。 朝鮮の文廟制度は宋と元の制度に従った反面、明と清での変化は全く受け入れなかった。1761年に北京を訪問した朝鮮使臣団は朝鮮の文廟制度を基準として清の文廟制度を批判した。朝鮮と清は孔子を最高の師として仰ぐ儒教国家という共通点があったが、自国の特徴を強調する方式で文廟制度を運営した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