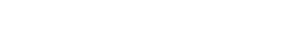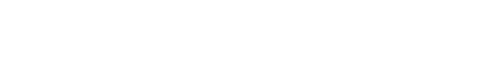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김창수, 耳溪 洪良浩의 華夷觀과 청 인식의 두 층위, 사림, 2019.07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27
- 조회수: 1673
논문제목 : 이계 홍양호의 화이관과 청 인식의 두 층위
저자 : 김창수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 「사림」 제 69 호
발행처 : 수선사학회
주제어 : 화이관, 북학, 홍양호, 인식층위, 지식구성
<요약>
문명의 척도를 기준으로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華夷觀은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자기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식 중 하나였다. 화이관의 시발점으로서 中華문명이 箕子를 통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는 기록은 학문적 검증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신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이관은 학문 나아가 정치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식권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화이관은 조선후기 문화사상과 함께 지식권력을 구명하는 핵심 소재가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화이관에 관한 연구는 당시의 사상적 흐름을 ‘조선중화’라는 틀로 정리한 이후 정치 사상 문화 부분에서 중화를 표방하는 다양한 양상을 포착해 왔다.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화이관에서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夷狄으로 간주한 청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최근까지 18세기 중후반 청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청 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일련의 학자들의 지향을 ‘北學’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해왔다. 연구의 범위를 문학으로 확대해보면 북학자들의 상당수가 道文일치를 지향한 성리학적 글쓰기를 비판하며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북학과 새로운 글쓰기에 관한 연구들은 두 가지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지적 분위기와 비교할 때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화의 동인으로서 청을 夷狄으로 여기는 당대의 주류적 분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혹은 진보적인 사유에 기반하여 청에 대한 보수적 화이관을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화이관으로 좁혀서 본다면, 가장 혁신적인 입장은 청을 중화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구도에서는 청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는 입장과 청을 오랑캐로 규정하고 문물 수입을 거부하는 입장은 명확히 대척점에 서게 된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화이관에 대해 극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보수적으로 견지되었다는 식의 일면의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것을 지양한다. 오히려 주목하려는 부분은 화이관과 직결된 청 인식의 이중적인 측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중은 洪羲俊의 청 인식과 화이관을 분석하면서 가장 청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홍희준의 사유 속에 청에 대한 인정과 우월의식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배우성은 지식의 위계에 주목하여 朴趾源과 李德懋 등 주요한 북학파들이 소품체 등의 새로운 글쓰기가 아니라 성리학적 글쓰기와 가치를 중요시했으며, 새로운 지식은 그들의 지식 체계에서 성리학보다는 낮은 위계를 지녔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순된 지식의 공존과 혼재 또는 지식 층위의 다양성을 드러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연구방법론으로서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분석대상인물로서 耳溪 洪良浩를 선택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노론과의 대립을 명확히 했던 소론 준론계이다. 사도세자의 폐위문제, 탕평파와의 대립 등에서 그의 정치적 입장은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京華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써 서울 지식인들과의 풍부한 인적관계를 맺고 역사 지리 언어 풍속 경학 등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 차례의 燕行을 통해 청의 현실을 직접 확인했으며 이를 계기로 청 문물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을 전개했다.
본고에서는 홍양호의 화이관과 청 인식이 燕行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그가 연행 이전에 지녔던 청 인식을 분석하여 해당 인식이 가진 특징들을 드러낼 것이다. 다음으로 두 차례의 연행 과정과 연행 이후에 보인 청 인식을 검토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1차와 2차 연행의 차이도 확인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인식의 층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지식인의 인식 층위 안에서 변화한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양자의 관계 속에서 지식의 존재 양상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