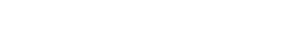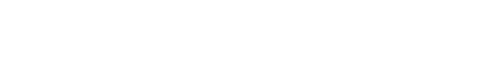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김경남, 일제 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동아일보 ‘전설의 조선’ 연재물을 중심으로-, 동방학, 2019.0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26
- 조회수: 1402
논문제목 : 일제 강점기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에 따른 전설 채집 활동의 의미-동아일보 ‘전설의 조선’ 연재물을 중심으로-
저자 : 김경남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 「동방학」 41
발행처 : 동양고전연구소
주제어 :
<요약>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 1920년대 조선학과 민족학의 지식 지형 형성 과정에서 전설 채록 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조선학’이라는 용어는 1926년 전후 식민시대 조선인의 ‘자기 알기’를 위한 지적 운동으로 출발한 것으로, ‘조선심’, ‘조선정신’, ‘조선사상’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이 시기는 1920년대 전반기부터 활발했던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의 분위기 하에서 ‘좀 더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는 시대사조가 팽배해 있었으며, 신화와 전설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일보』1927년 8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69회에 걸쳐 채록된 ‘전설의 조선’은 1910년대부터 존재했던 ‘동화 채록’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 당시 구전 전설 채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구전 전설 채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조선학과 민족학이라는 지식 지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조선학은 본질적으로 역사학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했으나, ‘조선심’, ‘조선사상’을 강조하는 인류학, 문화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0년대 전반기부터 활발했던 민족운동과 문화운동은 조선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신화와 전설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동아일보』‘전설의 조선’에는 총52편의 전설이 채록되었는데, 인물과 시대의 혼란, 구전 채록 형식에서 비롯된 다듬어지지 않은 문체 등의 한계를 보이기도 하지만, 필자가 전국적이라는 점, 고증적인 태도와 민족생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채록했다는 점 등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