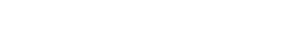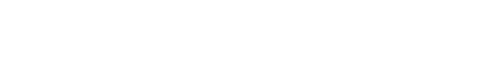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최승은, 『미야코 명소도회(都名所??)』에 나타난 풍속 지식을 통해 본 서적의 의의, 일어일문학, 2019.0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16
- 조회수: 1421
논문제목 : 『미야코 명소도회(都名所??)』에 나타난 풍속 지식을 통해 본 서적의 의의 -소형 명소기 『게이조쇼란(京城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저자 : 최승은(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일어일문학」 83
발행처 : 대한일어일문학회
주제어 : 미야코 명소도회, 게이조쇼란, 풍속 지식, 명소기
Miyako meishozue, Keijo shoran, knowledge of local culture, meisyoki
<요약>
18세기에 들어 주요 가도(街道)의 숙박 시설 확충, 교통 환경의 호전 등으로 말미암아 여행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었고, 『도카이도추 히자쿠리게(東海道中膝栗毛)』 등 기행문학의 유행 역시 여행에 대한 욕구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따라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행 안내기의 출판이 성행했는데 명소도회(名所??)는 그 중 하나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미즈에 렌코(水江漣子)는 명소도회의 성립 과정과 관련하여, 기행문학에서 출발한 명소기류는 17, 18세기를 정점으로 하여 『교와라베(京童)』(1658),『에도 명소기(江?名所記)』(1662) 등 ‘서사성이 후퇴된 가나조시의 명소기’를 거쳐, 『교스즈메(京雀)』(1664), 『에도스즈메(江?雀』(1662), 『에도카노코(江?鹿子)』(1687) 등 실용성이 강조된 명소기로 발전했다고 개괄한 바 있다. 그 시작을 기행문학에 두고 있지만, 점차 문학적 요소는 사라지고 삽화나 지도, 숙박 안내 등 실용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되면서 현재의 여행 가이드북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일본 근세의 여행이 서민 친화적인 형태로 발전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주된 향유층인 서민을 고려하여 삽화나 지도 등을 다용(多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실용적 명소기류는 18세기까지 유행하다가 18세기 후반부터 더욱 실용성이 더해져서 다양하게 파생되는데, 도중기류, 명소도회 등이 그것이다. 편의상 실용성으로 통칭하지만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가령 도중기류는 실제 휴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가이드북으로서의 특성이 강조됐다. 반면 명소도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록 지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림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록 지식이 다양화되어 실용성(유용성)이 극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근세 명소기류는 여행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화되었던 것이다.
본고는 명소기류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명소도회 중에서도 그 효시라 할 수 있는 『미야코 명소도회(都名所??)』(1780)의 제작 과정과 향유 방식, 그리고 수록 지식을 살펴봄으로서 기존 명소기류와의 차별성을 고찰하고 『미야코 명소도회』만이 지닌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야코 명소도회』는 최초의 명소도회라는 점에서 문학, 미술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선행연구가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근세 명소기류가 다양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명소도회와 소형 안내기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명소기가 같은 대상을 각각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횡단적인 비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이바라 에키켄의 『게이조쇼란(京城勝?)』(1706년 서문 성립)과의 횡단적 비교를 통하여 새롭게 등장한 『미야코 명소도회』의 특징을 특정하고 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