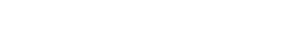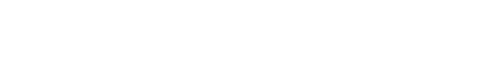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최석원, 문학적 전범으로서 ‘唐詩’에 대한 지식의 유통과 확산 ? 朝鮮의 唐詩選集 간행과 수용의 역사를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2019.0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7.25
- 조회수: 1357
논문제목 : 문학적 전범으로서 ‘唐詩’에 대한 지식의 유통과 확산 ? 朝鮮의 唐詩選集 간행과 수용의 역사를 중심으로
저자 : 최석원(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 「중국어문논총」 제 93집
발행처 : 중국어문연구회
주제어 : the collection of Tang poetry, the circulation of the Tang poetry, acceptance of Tang poetry, the spread of knowledge, Joseon(朝鮮) literati
<요약>
서동은의 설명을 빌리자면, 토마스 쿤(Thomas S. Kuhn)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 보편타당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과학 역시 역사적 상황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지식’ 담론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일찍이 피터 버크(Peter Burke)는 “지식이 특정 시대와 장소,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일상이 묶여있다” 고 한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언급을 인용하며 지식 역시 그것이 속한 다양한 역사적 상황, 공간 등에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한 바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이렇듯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동일한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수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唐詩’라는 문학적 전범이 選詩 라는 과정을 통해 조선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일찍이 張伯偉가 논의한 바와 같이 선집의 역사는 ≪詩經≫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詩經≫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305수로 편성되었는지에 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옛날 시가 3천여 편이었는데, 공자에 이르러 그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예의에 쓸 만 것을 취하였다.”라고 한 司馬遷의 언급은 선시라는 문학적 행위가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司馬遷은 ≪詩經≫은 孔子가 확립한 ‘禮’와 ‘義’라는 비교적 분명한 기준을 통해 산거되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중국 문학의 역사 속에서 선집이 나름의 뚜렷한 문학적 기준이 작동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최근 선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하겠다. 필자는 明代 편찬된 高棅의 ≪唐詩品彙≫, 李龍의 ≪唐詩選≫, 鍾惺과 譚元春의 ≪唐詩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당 唐詩選集들은 이민족 통일국가던 ‘元’ 뒤에 위치한 ‘明’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학적 가치의 제고라는 목적의식이 唐詩의 정전화로 이어졌음을 규명한 바 있다. 후술하겠지만 강서시파의 영향 속에서 唐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한 16세기 조선 문단에서는 명대 의고주 의자들의 唐詩 인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으며, 당시 이들이 편한 唐詩選集이 조선 문단에서 활발하게 유통되었음도 이러한 문학적 배경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6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조선 문인들은 그동안 유통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唐詩選集을 편찬하였던 바, 본고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선’이라는 특정 공간 속에서 선시를 통한 ‘唐詩’라는 문학적 전범에 대한 규정 및 그 인식에 대한 양상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 내 문헌교류와 관련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唐詩選集을 비롯한 選詩와 選集에 관련한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張伯偉의 논의는 물론이고 특정 작가의 작품을 바라보는 의도인 시각이 詩選 과정에 개입되어 있음을 언급한 이창경의 논의 등은 선시에 한 새로운 잡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황위주는 강서시파 계열의 작품군들이 다수 포함된 중국 시선집이 조선 시대 전기에 주로 간행되었음을 통해 당시 문단에서는 文以載 道론이 아닌 작품의 격식과 예술성 탐색을 중시하였음을 밝힌 바 있으며, 조융희 역시 17세기를 표하는 許筠, 申欽, 李?光의 중국시선집 수용 양상을 통해 그들의 문학적 이론과 비평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좀 더 범위를 좁혀 唐詩選集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금지아와 노경희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금지아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唐詩選集 희귀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唐詩選集들이 지닌 문헌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 바 있으며, 노경희 역시 明과 조선 그리고 일본에서의 唐詩選集 수용과 문헌 교류 양상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당시에 대한 접근의 제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특정 시기 혹은 개별 문헌들에 대한 고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조선에서의 唐詩選集 간행의 특징과 의미에 한 종합적 이해에는 도달하지 못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에서 간행된 唐詩選集의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함은 물론이고 ‘唐詩’로 대변되는 문학 전범이 ‘조선’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활용되고 수용되는 양상과 그 특징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