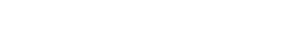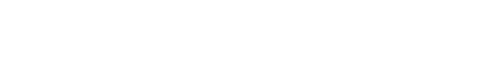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김경남,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문체 점변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2019.0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4.30
- 조회수: 1300
논문제목 : 지식 지형의 변화에 따른 조선 시대 문체 인식의 태도 연구-문체 점변을 중심으로-
저자 : 김경남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한민족어문학』제 83집
발행처 : 한민족어문학회
주제어 : 문체, 문심조룡, 과문(科文), 지식 지형, 문체 변화
<요약>
이 글은 유협(劉?)의 『문심조룡』과 조선왕조실록의 ‘문체(文體)’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지식 지형의 변화가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둔 글이다. 문체란 문장의 체재(體裁)를 의미하는 말로, 근대의 작문 이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널리 쓰였던 용어이다.
동양의 전통적인 문체는 유협의 『문심조룡』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사서(經史書)의 체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전통이 강한 중국에서 진실하고 도덕적인 글이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문심조룡』에서는 이를 ‘원도(原道)’라고 표현한다. 이 책의 ‘종경 제3(宗經 第三)’에서는 전통적인 문체가 경사서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각각의 문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 시대의 문체 논쟁은 주로 과문(科文)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는데, 과문에 쓰이는 각각의 문체가 지켜야 할 조건을 따르지 않는 현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문체 논쟁이 순수한 글, 도덕적인 글이 변질되어 감을 비판하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지식 지형의 변화와 문체 논쟁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정조 연간 서학이 만연됨에 따라 문체상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음을 비판한 논쟁을 통해, 문체가 지식 표현의 수단이며, 이에 따라 지식 지형의 변화가 문체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