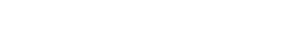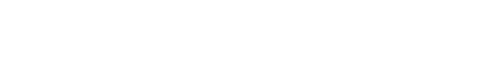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최승은, 근세 초기 명소기(名所記)의 지식 구현과 전달의 방법에 관한 고찰-문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019.0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4.30
- 조회수: 1346
논문제목 : 근세 초기 명소기(名所記)의 지식 구현과 전달의 방법에 관한 고찰 -문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최승은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등재지 : 『일본어문학』 제84집
발행처 : 일본어문학회
주제어 : 명소기, 가나조시, 지리적 지식, 명소
<요약>
명소기란 명소 안내서로서 가공의 인물을 등장시켜 명소를 찾아가고 소개하는 소설적 구성을 갖춘 작품을 말하며, 근세 초기 가나조시(?名草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지역적으로는 도카이도(東海道), 교토(京都) 등지를 대상으로 한 작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교토부자료목록(京都府資料目?)』에 따르면 전국에서 명소기의 대상 지역으로 가장 먼저 다루어진 곳은 교토이며, 그 지역과 관련된 명소기는 근세에만 246종이 발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에도 등 신흥도시를 대상으로 한 명소기도 잇따라 출판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힘으로서 그 지역의 명소가 널리 알려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다수의 가나조시 저작물을 창작한 아사이 료이(?井了意, 1612-1691)의 『에도명소기(江?名所記)』(1662)는 총 7권으로 구성되며 에도의 명소 80곳을 소개한 명소기로서, 최초로 에도의 명소만을 대상으로 집필된 명소기라는 의의를 가진다. 『에도명소기』를 시작으로 이후 십여 년 간 『에도스즈메(江?雀)』(1662), 『무라사키노히토모토(紫の一本)』(1683), 『에도카노코(江?鹿子)』(1687) 등 에도의 명소를 다룬 명소기가 잇따라 출판되었다.
이러한 명소기는 일반적으로 가나조시의 작품군으로 포함되지만, 명소기의 문학적 요소에 집중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다. 물론 가나조시 장르에 편입시켰다는 점 자체가 문학적 요소를 평가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선행연구의 경향을 보면 실용성에 특화된 장르로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근세 중기 새롭게 탄생하여 유행한 도중기(道中記)의 전 단계로서 근세 여행문화의 확산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활용한 연구가 압도적이다. 도중기는 여행자들이 여행 도중에 참고할 수 있는 안내기로서 대체적으로 12cm×18cm 정도의 소형 사이즈로 휴대하기가 간편하며, 서술자의 등장 없이 사실에 근거한 일종의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도중기와 명소기를 같은 유형으로 넣음으로써 근세 여행 문화를 촉진하는, 혹은 여행 확산에 기인하여 탄생한 여행 서적의 한 예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주된 연구 방향으로는 명소기를 토대로 하여 당시 명소의 상황을 고찰하는 연구이다. 신생 도시인 에도를 비롯하여 근세 초기에는 도시의 발달에 따라 명소기가 다수 발간되었는데 이들 도시 명소의 형성 및 그 특징을 명소기를 통해 고찰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우선 명소기가 장소나 지리적 지식을 이렇다 할 수사(修辭) 없이 정보 위주로 적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지(地誌)의 한 유형으로 평가되어 왔다는 배경이 존재한다. 또한 문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기행문학으로서 그 기록성에 방점을 둔 연구가 중심을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소기류 중 문학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쿠사이(竹?)』(1621 성립 추정),?『교와라베(京童)』(1658) 등의 명소기류도 근세 기행문학의 범주 안에서 거론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기행문학은 일종의 기록문학으로서, 작자의 상상력과 허구적 구성의 창조적 문학과는 구분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지지 혹은 기록문학으로서의 특징이 강조되어 장소나 지리적 지식 전달이라는 실용성에 편중되어 연구되어 온 것이다. 여타의 근세 기행문학이 그러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명소기는 형태상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성격에 맞추어 당대의 시대상을 파악하는 사료적인 수단으로서 ‘애용’되어 왔음은 분명하다. 예외적으로 앞서 언급한 『지쿠사이』의 경우 이세모노가타리 등 고전의 패러디 서술 양상 등 명소기의 실용성보다는 문학적이고 오락적인 요소에 집중하여 그 가치를 평가한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명소기 전체가 아닌 특정 작품에 집중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사료적인 수단으로서의 명소기가 아닌, 문학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실용적인 수단으로서의 명소기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명소기가 문학적 요소의 희박함 때문에 문학 작품으로서의 위상이 외면되어 왔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위상을 검토하는 일은 명소기의 연구 영역을 넓히는 데에 있어 필요한 작업이며, 나아가 지리적 지식을 만들어내고 전달함에 있어 문학적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살펴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