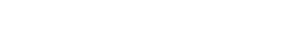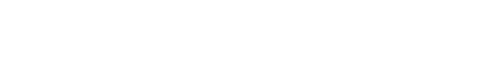연구논문
연구논문
김병진, 후생성 설립과 우생정책에 관한 공중위생적 접근, 2024.10
- 작성자: admin(단국대)
- 작성일: 2024.10.18
- 조회수: 1097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글로벌 메가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지금, 각 국가마다 대책을 발표하며 ‘국가 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일본이나 한국 역시 초저출산을 경험하며 경제, 정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본고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출산의 관리, 대응에 관한 국가적 ‘인적 관리’ 측면에서 재질문해 보고자 한다. 출산에 관한 국가적 개입은 공중위생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 말부터 일본은 ‘인적 자원’의 배양과 동원을 목표로 개인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국가 관리 체제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후생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생성의 설립 과정은 인구문제가 인구 자원 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청소년, 청년층의 사망률을 낮추고,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적 의미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후생성은 설립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후생성의 설립 과정을 보면, 당시 인구문제를 의료와 위생학적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목적이 컸다. 영유아나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의 사망률을 낮추고, 질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The declining birthrate, along with the aging population, is a global megatrend. Now that we have entered the so-called “era of declining birthrates,” countries are announcing countermeasures and responding to the “disappearance of nations. However, the solution is not easy. Japan and South Korea have also experienced a super low birthrate, and although they have taken measures on various fronts such as economy, politics, and education, they have been widely criticized.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is fertility problem from the aspect of 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response to childbirth. As a result, it will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historicity of the public health dimension of managing childbirth. By doing so, we hope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essential alternatives to the fertility problem. State intervention in childbirth is closely linked to the birth of public health: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Japan began to develop a system of state control over the lives and health of individuals, with the aim of developing and mobilizing ‘human resources’. As a resul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born. In particula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ws that population problems are directly linked to the public health implications of population resource management, reducing the mortality rate of infants,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and enabling them to live healthy lives.
少子化は、高齢化とともに世界的なメガトレンドといえる。いわゆる「少子化時代」に突入した今、各国が対策を発表し、「国家消滅」に対応している。しかし、解決は容易ではない。日本や韓国も超少子化を経験し、経済、政治、教育など様々な面で対策を打ち出したが、批判の声が大きい。本稿では、このような少子化問題を、出産の管理、対応に関する国家的な「人的管理」の側面から考察してみたい。 出産に関する国家的介入は、公衆衛生の誕生と密接な関係がある。19世紀末から日本は「人的資源」の育成と動員を目指し、個人の生命と健康に対する国家管理体制を構築してきた。 その結果、誕生したのが厚生省といえる。特に、厚生省の成立過程は、人口問題が人口資源管理の観点から、乳幼児、青少年、青年層の死亡率を下げ、彼らが健康に暮らせるようにするという公衆衛生的な意味と直結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厚生省は成立と同時に日本帝国主義の中核機関として活用された。しかし、厚生省の成立過程を見ると、当時の人口問題を医療と衛生学的な次元で保護する目的が大きかった。乳幼児や青少年のような未来世代の死亡率を下げ、質的に健康的な生活を送れるように国民の健康を増進することであった。